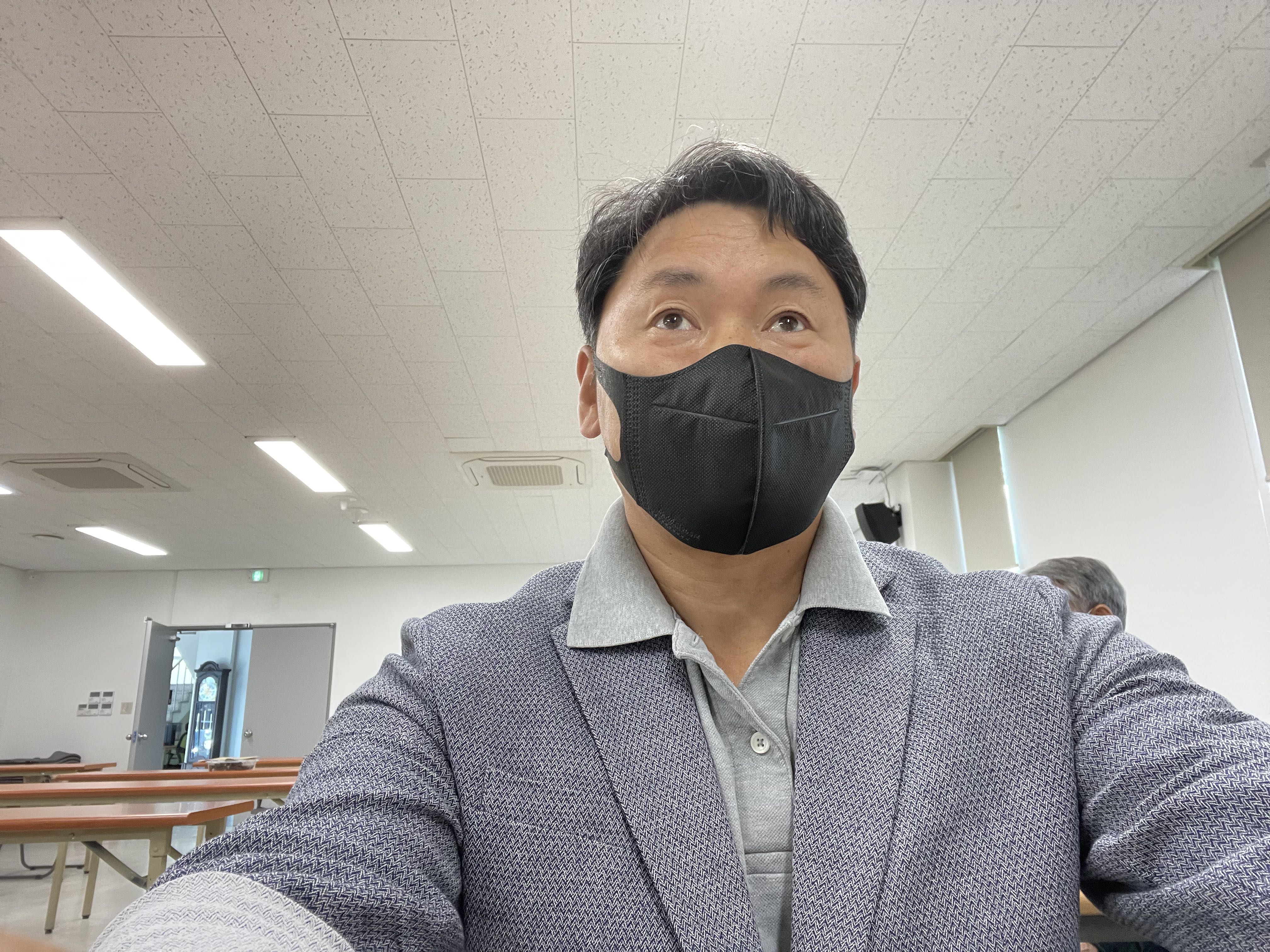1. 최근 한국의 SNS에서는 휴대전화 사진으로 '지브리'화풍으로 그려준 만화그림을 만드는 것이 유행입니다.
휴대폰 카메라로 찍은 사진은 너무 사실적이어서 보기에 부담스러울 때가 있었는데, 만화 캐릭터 형태로 단순화된 그림은 편하게 볼 수 있고 그 때의 추억을 회상할 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2. 챗-GPT에서 제공하는 기능으로 사진을 올리면 지브리 화풍 그림으로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AI(챗-GPT)가 사진을 그림으로 그려줄 수 있는 것은 지브리 화풍이라는 만화를 학습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AI가 만능에 가깝게 여러가지 일을 도와주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학습자료를 통해 학습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저작권 문제와 연결됩니다.
3. 저작권을 중시하는 원자료 소유자는 AI가 학습해서 제공하는 것이 불법이기 때문에 정당한 댓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에 AI사업자는 원 소유자측 자료를 이용해 학습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저작권료를 지불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중심에는 AI가 학습한 원래 자료가 무엇인지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저작권 침해를 증명하려면 AI가 특정 자료를 통해 학습했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하는데 AI사업자는 학습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현재로서는 생성형 AI가 어떤 데이터를 학습했는지 공개되고 있지 않아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저작물이 이용되었는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점이다.
먀 개발자 사업자가 생성형 AI에 학습된 데이터를 공개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전 세계적으로 이미 학습 과정에서의 저작물 무단 이용에 관해 여러 저작권 침해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많은 소송에서 원고는 자신들의 저작물이 무단으로 이용되었다고 주장하고, 사업자는 그렇지 않다고 반박하며 대립하고 있다.
(출처 이슈와 논점 2355호 국회입법조사처)
4. AI 학습데이터 공개 의무화와 관련하여 권지자(저작권자)와 사업자는 상반된 의견을 보이고 있는데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재는 AI가 어떤 학습데이터를 토대로 산출물을 생성했는지 외부에서 알 수 없어 증명하기 어렵다. 따라서 주관적 요건인 의거성은 침해자의 권리자의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었다는 사실과 두 저작물 사이에 유사성이 있다는 간접사실로 추정할 뿐이다.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에서는 학습데이터 공개 의무화에 대한 입법을 진행중이고, 유럽연합에서는 학습데이터 공개 의무를 인공지능 관련 별도 법제를 통해 규제하고 있습니다. 최초로 인공지능법을 제정했고 2025년 8월부터 시행되게 됩니다.
5. 우리나라도 인공지능 기본법에 사업자가 권리자의 요청에 따라 저작물 학습 여부를 개별적으로 공개하는 제한적 공개 규정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추세대로라면 인공지능(AI)가 많은 일을 할 때 사용하는 데이터(자료) 중에는 일반인들이 찍은 사진이나 그림, 글 등 다양한 내용이 학습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그럴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많은 기능으로 엄청난 돈을 벌게 되는데 이러한 원자료 저작권자에게 얼마의 저작권료를 지불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6. 생성형 AI는 학습데이터를 공개하고 저작권자에게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권리는 법률로 제정되어야 하고 이익이 보호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상에 올린 수많은 이야기와 사진, 그림 등 자료를 AI가 사용한다면 마땅히 그러한 사용료를 원 자료 제공자에게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이 글은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2355호)에 실린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